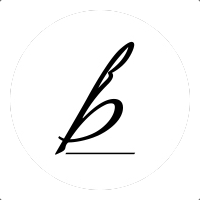―――
앞선 장에서 저자는 바우디의 말을 인용하며, 그가 '연애를 통한 기존 세계의 파괴', '사랑을 통한 새로운 세계의 구축'을 이야기했다고 요약합니다. 우연한 만남으로부터의 사랑이 사회 계층, 집단, 파벌, 국가가 가진 동일성이라는 두꺼운 벽을 허물 수 있다고요.
이번에 함께 읽은 내용은 이를 심화하는 내용입니다.
책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연애란,
새로운 세계와 진리를 구축하는 모험.
하나의 관점이 아닌 둘의 관점에서 형성되는 하나의 삶.
연애하는 세계는 '둘이 등장하는 무대'.
차이가 있는 둘의 관점에서 하나의 세계를 함께 바라보며 구축하는 것. (동일한 하나의 차이)

하지만, 이는 '낭만적 사랑'과는 구분됩니다. 그것은 '한순간에 불타버리고 융합해 버리고 소진되는 강렬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키비가 <자취일기>에서 '각자 화분'이라고 언급한 것처럼 존재론적 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존재론적 거리는 마종기의 시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시에서 연애의 대상은, '아득하게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존재론적 거리 외에도 사랑을 위해 필요한 것은 '지속성'과 '충실성'입니다.
그것은 갈등과 권태, 여러 유혹 등을 극복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겠다는 삶의 자세를 노래한 시가 있었으니, 김종해의 <그대 앞에 봄이 있다>입니다.
파도나 바람과 같은 장애물에 대해서 부딪히지 않고 '낮게 낮게 밀물'치는 자세이지요.
그러다 보면 '추운 겨울'도 다 지나고 어느새 '꽃 필 차례'가 다가와 있을 거라는 인식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서로의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사랑의 충실성을 마음에만 간직하지 말고, '선언'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책임감을 불러일으킨다고 보는 것이지요.
사랑의 선언은 우연에서 운명으로 이행하는 과정이고, 바로 이런 이유로 사랑의 선언은 그토록 위태로운 것이며, 일종의 어마어마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해'라는 말이 현대 사회에서 의미 없이 사용되는 일이 많아 꽤 훼손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이 말을 아꼈다가는 정희성 시인의 시 속 상황처럼 미처 꽃도 피우지 못한 안타까운 말이 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할 대상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지요?
바디우가 강조한 '우연한 만남'을 마냥 기다리기만 해야 하나요?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저자는 에리히 프롬을 언급합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고, '수동적 감상'이 아니라 '능동적 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하지요. 다시 말해 사랑은 '참여하는 것'이지 '빠지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략)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 받기만 기다리는 것은) 그림을 그릴 줄 모르면서도 좋은 대상만 찾아내면 좋은 그림을 그릴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터무니 없다는 거지요.
이러한 삶의 자세는 유치환의 <행복>이라는 시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랑' 즉 '능동적 사랑'의 행복감을 깨닫고 노래한 작품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