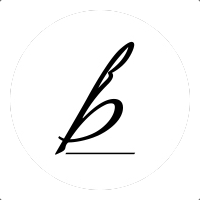📌 며칠 전, 페이스북에 썼던 글을 조금 수정하여 게시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변화가 느린 조직을 꼽으라면 '학교'도 꽤나 강력한 우승 후보이다.
그런 곳에서, 더욱이 관행을 바꾸는 데 기여할, 사소한 개선이라도 일어난다면 정말이지 매우 귀한 사건이다.
수능에서 소위 킬러문항을 배제하는 것도 ― 비록 궁극의 바람은 아니지만 ― 우리들의 비극적인 교육환경을 바꿀 수 있을 실질적인 힘이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에, 내게는 그 바라마지않던 '개선' 중의 하나였다.
올해 드디어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 같다.
그런데 전혀 기쁘지가 않다.
내게는 개선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가령 학생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라면, 학생이 개선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교육 현안 관련 문제를 개선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교육 전문가들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적어도 무게감 있는 목소리를 내는 자리는 되어야 한다. 사이비가 전문가 행세를 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관련 주체가 아닌 다른 사람은 입다물고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누구라도 얼마든지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개선의 주체들은 그 목소리들도 소중하게 들어야 한다. 그것이 시민사회의 본질이다. 그러나, 역시 개선의 주체는 당사자여야 한다. 남이 결정한 것들에는 쉽게 저항감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렇게 억압된 저항감은 미래에 다시 권력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영행력 있는 목소리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에서 갑작스레 정시 확대를 했을 때, 학종 정착을 위해 노력하던 교사들은 어떤 감정이었나. 나는 이때 느꼈던 참담함을 잊을 수가 없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가 아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아무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바로 이런 지점이 교육자로서의 효능감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요즘 교사를 위한 체인지메이커 수업 방법, 디자인씽킹, 퍼실리테이션 등이라는 이름의 수업 모델이 인기다. 이런 수업이 지향하는 문제 해결 방식이 지닌 장점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문제 상황을 겪는 당사자들에게 끊임없이 물어보며 상황을 이해하려 하고, 내세우는 대안이 대안으로서 적절한지 확인을 받고 개선한다는 것이다.1 이것이 공감이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남에게 해주는 것은 공감도, 적절한 대안도 아니다. 당사자들에게 물어보고, 피드백 받고,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 현실과 맞닿은 교육을 실천하고 싶은 교육자로서 ― 나 스스로도, 세상을 바꾸는 학습자들도 오만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스스로를 경계하고 성찰해야 하는 이유다.
공감이 위선이 되지 않도록.

- 원래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들도 종종 있다. 이렇게 운영하면 좋은 수업모델을 통해 위선과 오만을 길러주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