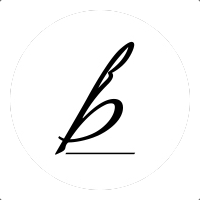이국종 교수님의 세바시 강연을 보고,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상심이 컸었습니다. '이게 나라냐'라고 여태 불평만 해왔지만, 이런 나라를 만든 것도 우리들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상심을 위로해준 제자의 글이 있어, 아주아주 약간의 편집을 하고 옮겨 보았습니다.
❝
대구에서 났지만 자라기는 포항에서 자란 내가 대학에 진학하겠다고 돌아온 대구에서 느낀 점 중의 하나가 '앰뷸런스' 소리가 적지 않게 들린다는 것이다. 그저 제대로 간호학을 공부하기 시작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저 기분 탓일 수도 있고 또 그저 어느 대학 병원 응급실 근처에 방을 구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종종 들리는 삐용삐용- 소리를 들으며 나는 몇몇 생각을 하는데 간추려 보자면 '저 안에 환자는 어디가 아픈 걸까? 어디로 가는 걸까? 무사했으면 좋겠다.', '생각보다 하루에 움직이는 구급차가 많구나.', '병원에서는 저 환자 받을 준비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겠네.' 그리고 '구급차가 빨리 병원에 도착할 수 있게 사람들이 배려해줬으면 제발!' 같은 것들이다. 마지막 생각을 하게 된 데에는 짧은 일화가 한몫을 한다.
하루는 (주말을 맞아서인지 방학을 맞아서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오랜만에 포항에 내려와서 형산강변 앞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그때 우측에서 흰색 구급차가 다급하게 삐용삐용 소리를 내며 달려왔다. (확실하진 않지만) 횡단보도 위에는 나를 포함한 6명 정도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발걸음을 멈추었다. 단 한 명을 제외하고는. 눈대중으로 짐작하건대, 중학교-고등학교 그 언저리 어느쯤 나이의 여학생이었다. 우리가 모두 멈춘 그 횡단보도 위를 유유히 느릿느릿 꾸준히 걸었고 결국 구급차는 그 학생을 기다리기 위해 속도를 줄였다. 그 학생이 지나간 후 다시금 속도를 올려 환자를 살리기 위한 질주를 시작했다.
혹자들은 말한다. '구조 헬기 그거 전문적인 거 맞아? 아니라던데.' 라든가 '헬기로 구조하는 거 산이나 바다 그런 데만 써야지 시끄럽게 주택가는 뭐하러-.' 라고. 나도 그저 새벽 2시에 자다가 푸드드드드득 하는 시끄러운 헬기 소리에 깬 적이 있다면 저렇게 투덜거렸을 것이다. 아니, 영상처럼 민원신고를 했으리라. 하지만 만약 내가 외상환자, 응급환자의 딸이었다면? 친구였다면? 가족이었다면? 나는 뭐라고 했을까. 그들은 뭐라 말했을까.
네 개의 바퀴로 차도 위를 달리는 구급차로 꺼져가는 생명을 병원까지 옮기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이유로, 최대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 가능성을 1%라도 올리기 위해 어떤 이들은 희생을 감수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지금 이 시각에도 헬기에 올라타고 간절히 날고 있다.
구급차가 달려오면 잠시 발을 멈추고, 차를 멈추는 것.
헬리콥터 날개 소음을 잠시동안 참는 것.
간단하지만 그 작은 행동으로 우리는 어떤 이를, 가족을, 친구를,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구할 수 있다.
나는 사람들이 모두 누군가를 돕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힘을 가지고 실천하는 데 익숙해지면 우리가 바라는 더 '나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부탁합니다 여러분.
― 글, 김지현(대구대학교 간호학과)